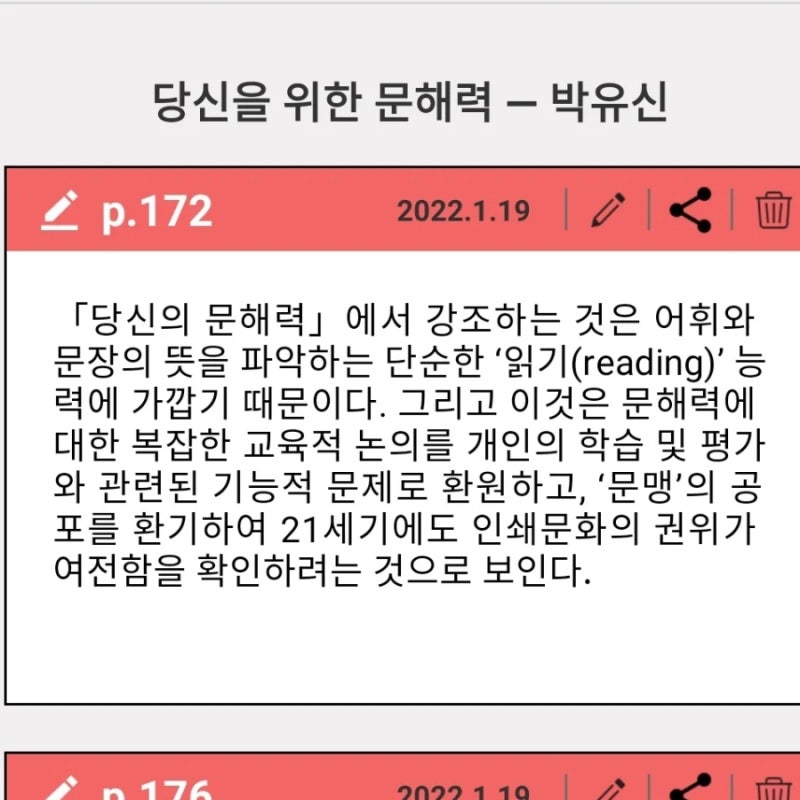#한편6호권위 #당신의문해력 #당신을위한문해력 #박유신
EBS의 <당신의 문해력>을 보고, 현재 현상을 잘 기록했다고 생각했다. 그 뒤, 조병영 교수의 #읽는인간리터러시를경험하라 단행본을 읽었다. 조병영 교수의 관점은 '삶의 전반에 걸친 이해, 분석, 종합적 사고력' 향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커뮤니티에서 한 편의 글을 알게 됐다. 민음사에서 발행하는 인문학 잡지 <한편> 6호에 관련된 글이 있다는 소식. 초등교사이자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자인 박유신의 글이었다.
요점은 첫째, EBS는 인쇄 미디어에 담긴 절대적 지식의 권위를 전제한다. 둘째, 삶의 변화에 따라 지식의 절대성도 상대성으로 바뀐다. 셋째, PISA등의 평가도구로 드러난 것은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부재다. 라는 것.
반박할 지점이 여럿이다. 하나, EBS의 현상 지적은 문제제기와 사회적 시선집중 자체로 의미 있다. 덕분에 문해력-리터러시가 논의 대상이 됐다.
둘, 지식의 상대성은 각자의 일정한 지식이 토대가 되었을 때, 소통과 비교를 통해 맥락을 기반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눈사람을 만들려면 일정한 핵심을 확보해야 한다. 초등학생의 사례는 타당하지 않다.
셋, PISA가 지적한 '특이한 경우'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세계의 학생들과 다르게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라기 보다, '사실적 문장'과 '의견을 기술한 문장' 자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고 본다.
이미 학생들은 미디어 사용은 잘한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글'일 경우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삶을 둘러싼 환경은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미디어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개인의 시공간도 확장된다.
내가 파악한 학생들의 공통 문제점은 이렇다. 밀도 높은 정보를 소화시키지 못한다. 말, 영상으로 가볍게 풀어내는 정보만 이해한다. 추상적, 개념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정보는 처리하기 어려워한다.
글로 된 매체를 읽는 스키마-정보구조 체계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것은 인쇄 매체의 권위를 따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삶을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축적한 '세이브 파일'은 다 날아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