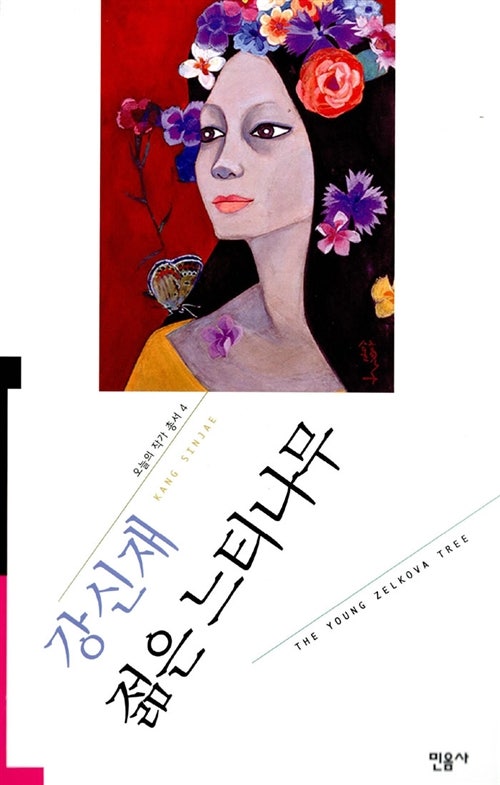#희랍어시간
21등2024.11.08

인플루언서
이종민
팬 6,595도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1![]()

희랍어 시간 - 말을 잃어버린 여자와 눈을 잃게 된 남자 이야기 (한강 장편소설)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희랍어 시간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었는데, 이제야 읽었다.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타지 않았으면 아마도 아직 못 읽었을 듯.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책과 사람은 인연이 중요하다. 관계는 의지로 되지 않고 인연으로 된다. 희랍어 시간은 꼭 읽겠다는 생각을 예전에는 왜 했을까. 기억나지 않고. 제목이 좋아서. 책 표지가 좋아서. 아마 그런 이유들. 아니었을까. 그 막막하고 먹먹한 세계로 이젠 기꺼이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되고 있는 남자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여자의 이야기. 재밌다. 이런 데는 재미란 낱말을 쓰기 미안하지만. 느낌이 좋은 책이었다. 좋다는 말도 이상하려나. 아무튼. 한강에 자꾸 빠져든다. 그 알싸한 매력. 떨쳐낼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시 같은 글. 화자가 자주 바뀌는 것도 싫었는데 이제 익숙해지고 있다. 그 입체감을 즐기고도 있는 것 같다. 라틴어 수업보다 먼 느낌, 희랍어 시간 바람이 분다, 가라에서는 자연과학이 나란히 따라붙더니, 이번에는 희랍어와 그리스 철학이 그 자리에 있다. 나는 과학보다는 철학이 좋고 언어가 좋은가 보다. 이 소설의 나란함이 더 잘 읽혔다. 소설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재미는 바람이 분다, 가라가 더 좋았다. 뭔지 모르겠는 느낌은 희랍어 시간이 좋다. 시 읽듯 소설 읽기에 이제 익숙해진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이 소설은 다 읽고 나니, 이야기가 (조금은) 있는 (조금은...
2024.11.08